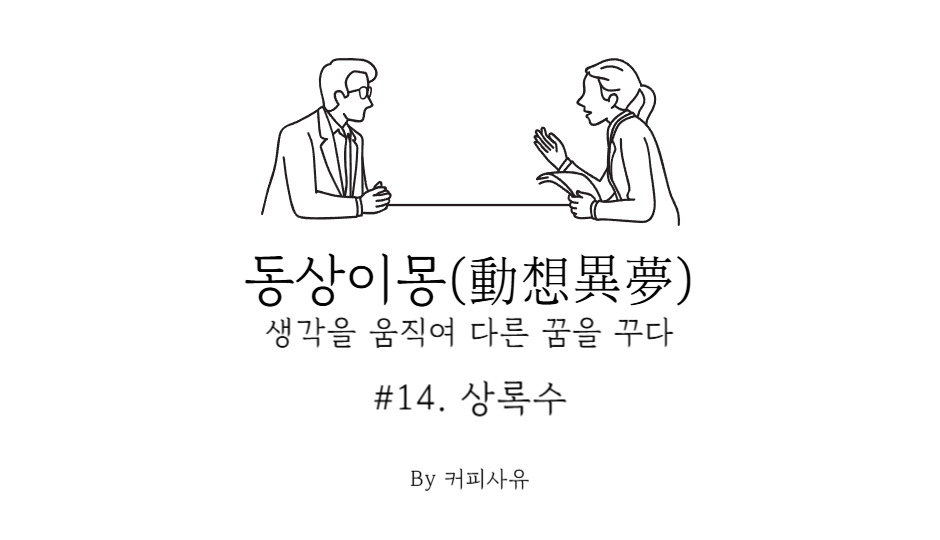
동상이몽 #14. 상록수
생각을 움직여 다른 꿈을 꾸다. 동상이몽(動想異夢) 시리즈는 Cafe 커피사유의 카페지기 커피사유의 시사 평론 및 생각 나눔의 장이자, 세상을 향한 이해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장들
폭풍전야.
나는 지난해 12월 14일을 회상해본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개월 전으로 되돌아가본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국회로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기말고사 기간이었지만, 바쁘고 힘겨운 와중에도 Youtube 생중계를 통해 흘러나온 국회의장의 발화만큼은 여전히 기억한다. 첫 두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나는 몇 달 전 고백했던 바를 되새겨본다. 분명히 지난 해 12월 3일과 4일, 나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실존적 위기 속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머리 위로는 헬기 소리가 내리쳤고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웅웅거리기를 멈추지 않는 휴대전화 화면으로는 사당 부근에 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나갔다. 그 기나긴 새벽의 마찬가지로 기나긴 통화에서 어머니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조용히 지내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처절한 어머니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았던가? 나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읊조려본다. 마음 속 한켠에서는 나 하나의 목숨이 설령 스러진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바뀌겠느냐하는 냉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냉소를 따를 수는 없었다. 부끄럽지 않고 싶었다. 언젠가 내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는 그때 뭐했어?”라고 묻는 순간이 내게 허락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말을 얼버무리거나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다. 그랬다. 나는 분명히 길 앞에 서 있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고 있었다.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국가란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을.
나는 지난 1월과 2월을 돌이켜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 뒤에 썼던 글에서 진술했듯 나는 스스로가 믿어왔던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원칙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했다. 광장에서 사람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뱉었다. 어느 순간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며 반국가적인 행태다!”라는 외침이 지나가는가 하면 또 어떤 순간에는 “망국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다!”라는 고함소리가 되돌아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마저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의 메시지에 들떠 어느 날 새벽에 법원으로 쳐들어가 창문부터 집기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부수고 문을 일일이 걷어차며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노라 소리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질문했다. “대관절, 국가란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월 이후로 내가 확인한 것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존재 목적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보도들, 그리고 12월 3일 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들에 책임 있는 자들이 “잘 모르겠다”, “TV 보고 알았다”, “답변드릴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장면이었으니까. 저 참담한 의문 속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희미한 직감,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절망을 보았다.
나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본다. 그러한 폐허 속에서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생업과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광장으로,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저 수많은 이들을 모르지 않는다. 저마다의 과거사와 삶의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큼은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있었던 바로 이들을 모르지 않는다. “국가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두의 마음 속에 울려퍼지는 이 질문 속에서 누군가는 분노했으며 누군가는 괴로워했고 누군가는 착잡해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눈동자를 관통하는 것들을 되짚고자 책장을 넘기며 흑백 사진들과 누런 종이들 위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읽어내린다. 오래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민중은 묻고 있었다. 1960년, 1964년, 1969년에 그랬듯이. 1973년, 1979년, 1980년에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저 헌법, 제9차 헌법과 함께 오늘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1986년과 1987년에 그랬듯이. 역사 속의 모든 이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대관절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계속해서 생각해본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 분열과 혐오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대화 나누기조차 거부하려는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여전히 간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것, 수많은 이들이 잊기를 거부한 바로 그것을 생각해본다. 77년의 역사를 거쳐 이른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한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내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한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친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나는 국회의장의 문장들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행간에 숨은 수많은 역사를, 오늘의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위해 흘렀던 수많은 피들을 생각해본다. 수없이 반복되어온 저 질문, “국가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본다. 늦지 않게 나는 그의 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음을,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떠올려낸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상록수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