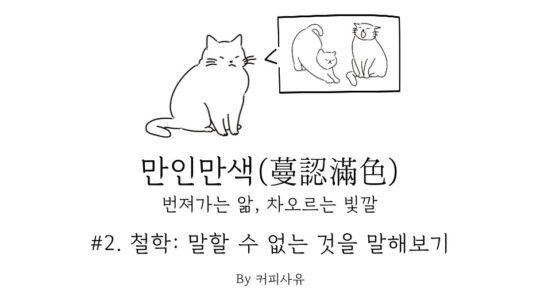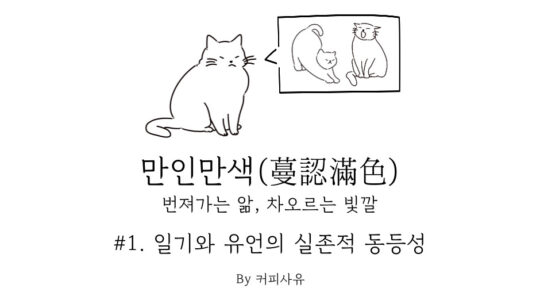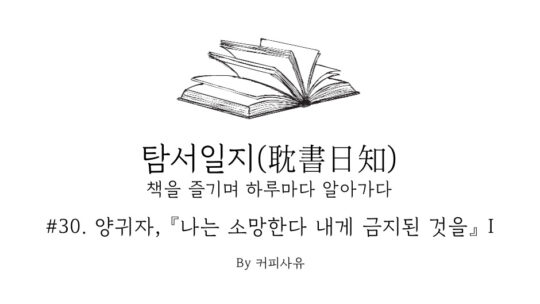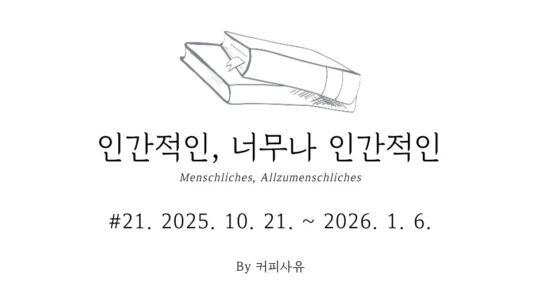만인만색 #2. 철학: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보기
2026-02-24카뮈가 시사하듯 우리의 존재 조건은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것’에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순간을 다하여 말하고, 채색하며, 의미를 변형하고 부과하는 존재다. 우리는 현상의 원인을 단일하게라도, 모든 존재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목해본다. 우리가 ‘바위를 밀어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바위를 밀어올리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