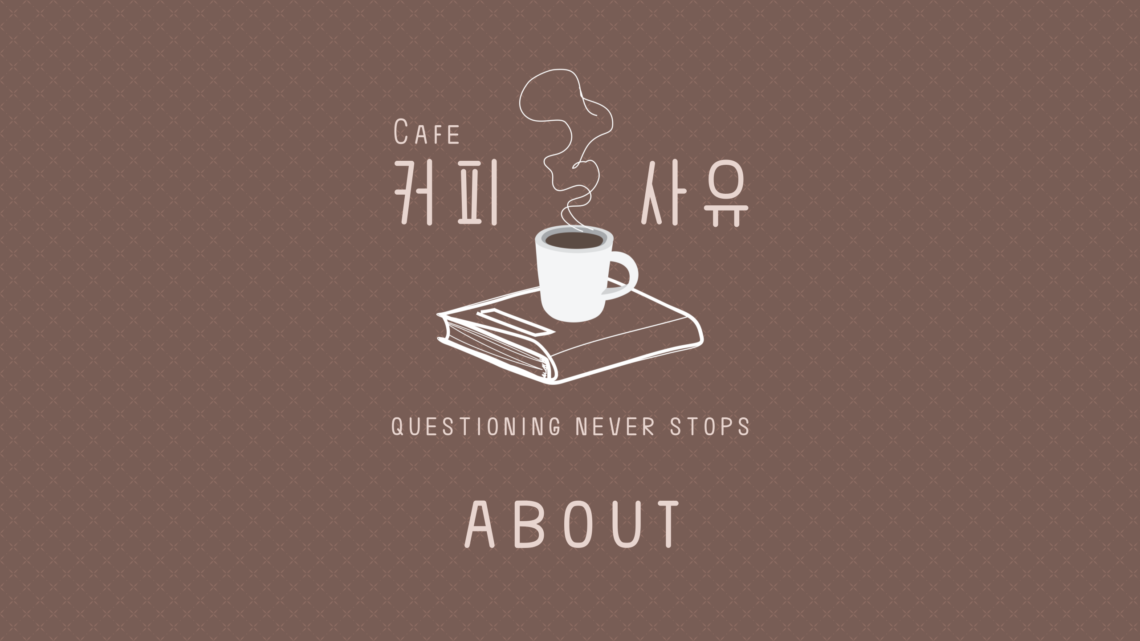드리는 말씀
KOR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시를 토하며 ‘이것이 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영역, 한 점을 찾아 헤맵니다.
체사레 파베세
제 자신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것들에 부딪히는 것이 삶의 숙명이라면, 이러한 삶 그 자체로의 모순은 어쩌면 세상의 모순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작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다른 이들까지 이해하라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새인가 정작 우리 스스로의 고유한 ‘아(我)’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가 부딪히는 모순(矛盾)에 마주했고, 마주하고,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혼란과 불안함의 세계로 전이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스스로의 ‘안주성’에 이끌려 어딘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강력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다시 원래의 ‘안정’으로 돌아오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떨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변화’와 ‘도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이겨내는 니체의 ‘자기 초극의 의지’의 피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어제의 스스로를 뛰어넘는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저지하는 이러한 ‘안정’으로의 욕구를 다시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회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안정’에 대한 욕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70~80년대의 독재 정권이 타도되고 제6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로, 우리는 어쩌면 잠시 주어진 평안에,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되었어’라고 타이르고 있었는지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점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我)와 타(他)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나 자신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 사람의 세계, 즉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모든 ‘생각’에서 기원한 것들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참과 거짓의 여부, 그리고 이 사회,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의견, 한 사회 내부의 공론, 누군가의 유/무죄의 여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소견과 심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我)와 타(他)의 충돌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가 세상에 맞지 않다고 너무 부정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우리 스스로를 피력해서, 그러한 충돌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향유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제 앞에 앉아 저를 부르는 듯 합니다.
천천히, 서두를 것도 없으니. 수많은 생각들과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충돌과 변화라는 한 잔의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는.
‘Cafe 커피사유’의 카페지기, 커피사유입니다.
ENG
If it is our own fate, that crashing into the things contradict against ourselves while we’re on this world, perhaps such that contradictions were directly connected with those world’s ones. At least, I guess so.
In nowadays, I’ve been concerned about just that things, which push us – those who haven’t understood themselves yet – to understand others, must be ended up with losing our own ‘personality’.
You, and I, have been encountered the contradictions that ‘Our own’ and ‘Their own’ crash each other, and of course, we’re going to encounter them even tomorrow morning after the night, living our lives in this strange world. Such existence of those ones always have been forced us to elevate to the dimension of ‘Confused’ and ‘Anxious’, and also we, have always forced us to back the world of ‘Stable’ and ‘Entire’, mentored by the need for a stable state. In that never-ending cycle, we’re suffering in some kind of the emotion of panic or such feelings like that, running and hoping for a successful escape from those fear of ‘Unstable State’.
However, in the perspective of Friedrich Wilhelm Nietzsche who claimed ‘Übermensch’, the kind of determination that ones, who are struggling to overcome themselves of past times could have, such ‘Unstable State’, could be demonstrated to the word ‘Change’ and ‘Challenge’, I think that it is a sure thing that we must review our own thinking against ‘Unstable State’.
Perhaps, the world is the same, just like ourselves. Our need for a ‘Stable State’ has been forced too many mouths to shut. After two huge world wars, maybe we’re too overdosed these short peace and ease ourselves with, “Enough”, just looking on our own thinking, to fade out, out of our mind.
It is the world of ‘Our own’ and ‘Their own’ as someone said before, meaning that one’s vision is formed by the collision between his own things and other’s things. But furthermore, I believe that we must expand this expression ‘Vision’ to all of the things that origins to ‘Thinking’. Yeah, all of true-or-false, all of the ideologies conquers our society and the world, relationship and opinion between man and others, public opinion of one of the society, whether the defendant is guilty or not in the court somewhere, and our judgment about ourselves are those, and weren’t those built upon the basis of the collision between ‘Us’ and ‘Others’?
Those thinking calls me, that instead of staying and blaming ourselves for not fitting with the world in the gloomy cloud we made, just why don’t we gracefully enjoy the harmony of collision and change, and ourselves, chang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by that, just saying we actually think, dream, and are eager to?
No need to hurry up, so slowly, gently, just laying down and talking and resting, with our own thinking –
And, just savoring those collisions and change with a cup of coffee slowly –
Here I am, the owner of ‘Cafe CoffeeThink’. CoffeeThink.
소개
호(號)는 사여명(思黎明)으로, 철학 · 문학의 영역들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람과 그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범하거나 통념적인 생각보다는 다소 위험하거나 발칙한 생각들, 무언가 뒤틀리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들에 도전하고 이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붕괴하고 그 붕괴되는 틈들 사이로 새로운 시각과 관념들이 쏟아져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강한 희열감과 흥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 성향이나 학문적인 욕구는 예전에 쓴 바가 있던 「사유 #25. 식인(食人)의 욕구」라는 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에는 학구열과 호기심이 넘치는 학자로, 밤에는 실리적인 프로그래머로,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만의 그 또렷한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블로거로 스스로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경남과학고등학교를 36기로 조기 졸업했으며, 2026년 2월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복수전공으로 학사 졸업했습니다. 자연계와 같은 복잡한 계를 이해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달성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사 과정 중에는 그 하나의 방법인 수치모델 연구에 높은 관심을 가져 대기과학과 컴퓨터공학을 주로 학습했지만 최근에는 문학 · 철학 · 사회 · 정치에도 폭넓은 관심사를 ㄱ가지고 있습니다. Trendous Development Alliance에서 Chief Developer(메인 개발자) 및 Planning Team(기획팀)으로 있었고, 현재는 개인 스튜디오인 dev. Coffee에서 Chief Develop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블로그에 많은 글들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SNS와 브런치(Brunch)를 통해 자체 선별한 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SNS에는 가끔 괜찮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전부 혹은 일부 인용해서 공유하고 있고, 브런치에는 이 블로그에 쓴 글 중 괜찮다고 나름 생각되는 글을 선정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Jazz나 Lo-fi, Classical 음악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행을 따라 한물가서 조용해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소 더디거나 마이너해서 변화가 느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르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직접 발굴하고 그 음악성을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해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 Email Address: stevenoh0908@gmail.com
- Brunch(브런치): @coffeethink
- Mastodon: @stevenoh0908@mastodon.social
- Github: Stephen Oh(@stevenoh0908)
- Youtube Channel: Cafe 커피사유
- Live 방송국: 커피사유의 방송국
독서
영화
좋아하는 문구
La vie à interpréter
해석하는 삶
나의 형제여, 그대의 눈물과 함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나는 자기 자신을 넘어 창조하려고 파멸하는 자를 사랑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Mit meinen Thränen gehe in deine Vereinsamung, mein Bruder. Ich liebe Den, der über sich selber hinaus schaffen will und so zu Grunde geht.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시를 토하며 ‘이것이 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영역, 한 점을 찾아 헤맵니다.
체사레 파베세
제 자신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이리하여 나는 부조리에서 세 가지 귀결을 이끌어 낸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반항,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열정이다. 오직 의식의 활동을 통해 나는 죽음으로서의 초대였던 것을 삶의 법칙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자살을 거부한다. 살아가는 나날 동안 줄곧 끊이지 않고 따라다니며 둔탁하게 울리는 이 소리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이 소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니체는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복종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결과 마침내는 가령 덕, 예술, 음악, 무용, 이성, 정신과 같은,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 모습을 바꾸어 놓는 그 무엇, 무엇인가 세련되고 광적인 혹은 신성한 그 무엇이 생겨난다.”라고 썼는데, 그는 그 말로써 위대한 풍모의 모럴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부조리한 인간이 가는 길을 보여준다. 불꽃에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따금 어려움에 맞서서 겨루어 봄으로써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유익하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기도는 생각 위로 밤이 올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랭은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신비주의자들과 실존주의자들은 대립한다. “그러나 정신은 밤을 만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감은 눈 밑에서 오직 인간의 의지에 의해 생겨나는 밤, 정신이 그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 불러일으키는 캄캄하고 닫힌 밤은 아니다. 만약 정신이 밤을 만나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맑은 정신을 간직한 절망의 밤, 극지(極地)의 밤, 정신이 깨어 있는 밤, 하나하나의 대상이 지성의 불빛 속에서 또렷이 보이는 희고도 때 묻지 않은 광명이 비쳐 올 밤이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면 등가성은 열정적인 이해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존적 비약을 비판하는 것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세기에 걸친 인간적 태도들을 보여 주는 벽화 속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관객이 볼 때 ― 그 관객의 의식이 또렷하다면 ― 이 비약 또한 부조리하다. 비약은, 그것이 역설을 해소시킨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바로 역설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는다. 이 점에서 비약은 감동적이다. 이 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부조리의 세계는 휘황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그러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정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단 한 가지의 보는 방법에 만족한 채 모든 정신적 힘들 중에서 가장 미묘한 힘인 모순 없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다만 어떤 사고방식을 정의한 데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사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pp. 97-98.
그러나 정결과 관능이 실제로 대립하는 경우에조차도, 다행히도 그 대립은 비극적인 대립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최소한 이러한 사실은 동물과 천사 사이의 불안한 균형을 삶을 부정할 수 있는 반대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 심신이 건강하고 쾌활한 모든 인간에게 해당할 것이다. 괴테나 하피스 같은 매우 섬세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불안한 균형을 삶의 자극으로 느끼기까지 했다.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사람들을 살도록 유혹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 박찬국 역, 아카넷, 2021. p. 174.
생각한다는 것은 보는 방법,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일이며, 자신의 의식을 인도하여 생각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를 프루스트처럼 특권적 장소로 만드는 일이다.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 김화영 역, 민음사. p. 47.
어디서부터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무지와 무능 속에 나 자신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하는가, 그리고 이 방황 속에서 다시 반복되는 공포의 포효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이 무지 때문에 나는 여기에 다시 서 있고 묻는 것이다. 수많은 이념과 사상가들이 거쳐간 대학의 땅에 서서 묻고 있는 것이다.
커피사유, 「부활 #3. 무지(無知)」
… (전략) … 제대로 잘된 인간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일을 한다는 점 : 그의 육체와 정신이 천성적으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우며 동시에 좋은 냄새가 난다는 점에서 알아차린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 자신에게 유익한 것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의 만족감과 기쁨은 중지해버린다.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만들 줄 안다 ;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모아서, 자기만의 합계를 낸다 : 그가 선택의 원칙이고, 그는 많은 것을 버려버린다. 그가 교제하는 것이 책이든 사람이든 지역이든 그는 언제나 자기의 사회 안에 처해 있다 : 선택하면서, 용인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는 경의를 표한다. 그는 모든 종류의 자극에 서서히 반응한다. 오랫동안의 신중함과 의욕된 긍지가 그를 그렇게 양육시켰다 ―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극을 검사해보지, 그것을 마중 나가지 않는다. 그는 ‘불행’도 ‘죄’도 믿지 않는다 :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잘 조절하며, 잊어버릴 줄도 안다 ― 그에게는 모든 것이 최대한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충분히 강하다. ― 자, 나는 데카당의 반대이다 :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진술한 것이니.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니체전집 15: 바그너의 경우 · 우상의 황혼 · 안티크리스트 · 이 사람을 보라 · 디오니소스 송가 · 니체 대 바그너》, 백승영 역, 책세상, 2002, 334-335쪽.
언젠가 저도 아들이 생기면 지금의 아버지의 위치에 제가 서 있게 될 것이고 제 아들이 지금의 저 자신의 위치에 서게 되겠지요. 그 때 아들이 〈제가 장차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라며 묻는다면 저는 무어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의 어깨에 걸려 있던 무게와 비애가, 그리고 어쩌면 일종의 죄책감. 그것들 모두가 당신의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걸려 있다는 사실이 되고야 마는 것일까요? 그래서일까요, 당신의 말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어떠한 힘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부딪혀봐야 바뀌는 것은 없고 너만 아플 뿐이다〉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순간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고 두렵게 들립니다. 제가 아프고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곁에서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웠던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어쩌면 무지와 무능 속에서 겁없이 세상을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는 당신의 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어쩌면 조금은 다른 결말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서사와 비슷한 결말로서 제 서사도 종결에 다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직면하게 될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해질 수 있는 그런 결말, 그리고 지금의 두려움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남을 수 있을 그런 조금은 색다른 결말을.
커피사유, 「두려움」
나는 사람들이 우울한 상념에 빠져들어야 분별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네.
몰리에르, 《인간 혐오자》, 이경의 역, 지만지드라마, 2019.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 서기에는 그 불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불가능을 향하는 인간,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한 번 더 기꺼이 밀어올리는 이 인간의 정신. 끝없이 되풀이되어 울려퍼지는 의미와의 투쟁, 잃어버린 대상을 향한 포효와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한 필사의 생(生).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주이상스〉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그런 위험한 직감들.
커피사유, 「Playlist | Jouissance」
좋아하는 음악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러의 음악을 이해하는 핵심은 대립되는 두 가지 양면성을 하나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죽음과 삶, 진지함과 농담, 숭고한 아름다움과 유행가의 통속성, 고전적 형식과 민초들의 자유스러움, 직관적 낭만주의와 차가운 이성의 대립각 같은 것들입니다. ‘그까이꺼 대충’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말러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평생 끌어안고 살았지요.
그는 삶을 사랑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들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달콤한 디저트를 즐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도 곧잘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들로 나가 그것들의 재롱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늘 죽음을 생각했지요. 말러에게 사신(死神)의 존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년기의 그는 14명의 형제 가운데 8명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사랑하던 큰딸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디프테리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망연자실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은 심장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문학수,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 경향신문 “당신의 클래식”, 2006. 11. 9. 中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쿠오바디스(Quo Vadis)’는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의 라틴어이니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다프트 펑크는 이 말의 철자를 바꿔 ‘Veridis Quo’라는 새 말을 만들었다. ‘Veridis Quo’를 소리나는 그대로 읽으면, ‘Very Disco’가 되고 이 두 단어의 배치를 바꾸면 ‘Discovery’, 즉 그들의 두 번째 앨범의 제목, ‘발견’이 된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의 곤란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Veridis Quo’는 발견의 음악인 셈이다. …(중략)… 이런 세상인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죽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은 빛 속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것에 무감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완벽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미세한 빛도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건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의 두근거림일 테니까. 다프트 펑크의 계속 이어지는 저 음률처럼.
김연수, 〈완벽한 어둠 속에서 빛의 소리를 듣는 일: 앤서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과 다프트 펑크의 「Veridis Quo」〉, 채널예스 “불후의 칼럼”, 2016. 8. 31.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