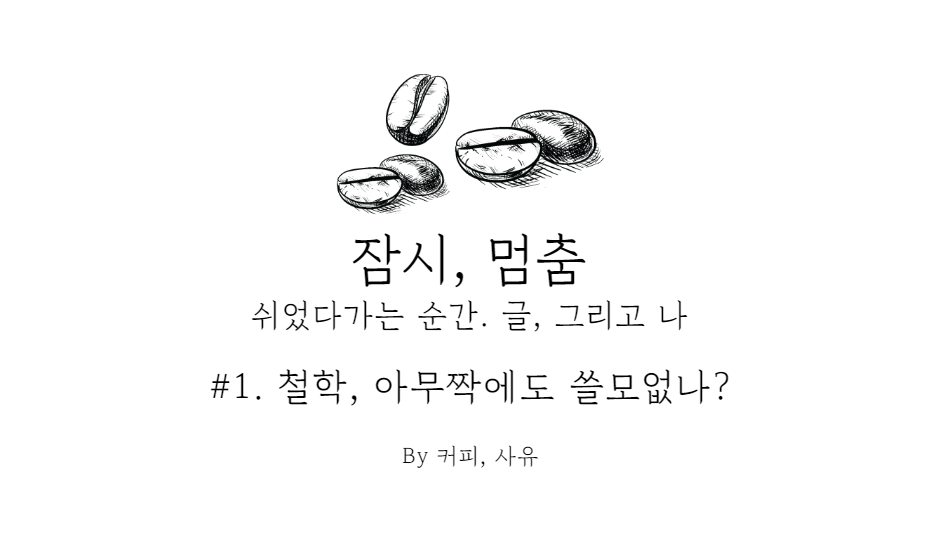
잠시, 멈춤 #1. 철학,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中
‘잠시, 멈춤’ 시리즈는 필자가 읽은 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일부, 혹은 전부 인용하는 등, 이 카페에 모아 두는 포스트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로 포스팅되는 모든 글의 경우, 필자가 쓴 글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 사용되는 모든 글의 출처는 포스트의 맨 하단에 표시합니다.
토론 이후, ‘철학, 삶을 만나다’의 내용 정도는 모두 익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역시 안이한 태도였을까. 그 다음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가족이 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겹침이면 그것이 뭐 어떻단 말인가. 국가가 국민을 수탈하는 폭력기구면 또 어떻단 말인가. 자본주의는 인간을 화폐의 노예로 만드는데 그것은 또 뭐 어쨌단 말인가.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답은 간단하다. 자본주의는 나쁘고 국가도 나쁘다. 작가는 그렇기에 이들에게 종속되지 말고 인간 주체로서 살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뿌리에 뿌리를 내리는 생각들은 과연 이것들이 그렇게나 나쁜가,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아니, 애초에 나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는 인간 행복에 반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가. 작가는 하나의 인간 주체로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것은 과연 옳은가. 행복한 노예와 불행한 주체 중 누구의 삶이 더 바람직한가. 애초에 인간의 삶에 잣대를 들이밀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람직함, 즉 인류 보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나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그러한 보편성 자체를 논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다.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좋고 나쁨, 도덕, 인간 존엄성, 인간 존재의 이유에 관하여, 한 번 던져진 질문은 그 뿌리까지 올라가, ‘에덴의 용’ 시대까지 거슬러 인간 주체의 본질에 관해 물었다. … (중략)
‘철학,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 강신주의 [철학, 삶을 만나다]를 읽고’. 김예원. 고전의 숲 과학의 길. 경남과학고등학교(2020).